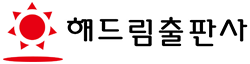십우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십우도(심우도)
요즘 구제역이 한창이다.
그런데 어제 노모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즈음 구제역은 사람이 받을 재앙을 소가 받는단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을 일을 소가 대신 죽는다는 것이다. 섬뜩하였다. 어머니는 불교신자이다. 그래서 불교와 소와의 관계를 찾아보다가 ‘십우도(심우도)’를 읽게 되었는데, 읽을수록 괜찮은 글이 있어 퍼왔다. 법리가 그렇듯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다.
‘수필을 구한다’라는 생각으로 읽어도 좋을 것 같다.
십우도란 본래 도교에서 나온 팔우도(八牛圖)가 그 시작으로 12세기 무렵 중국의 곽암선사(廓庵禪師)가 도교의 소 여덟 마리에 두 마리를 추가하여 십우도(十牛圖)를 완성시켰습니다.
곽암선사가 보기에 도교의 팔우도는 무(無)에서 끝나므로 진정한 진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한 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진리, 불교의 진실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를 소 두 마리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교의 팔우도를 무(無)의 결말이라면, 곽암선사의 십우도는 공(空)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십우도는 진리를 찾아가는 이에게 나침반이 될 것이고, 진리에 임하는 자세를 간곡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십우도를 여러분께 인연 맺어 줄 수 있음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소 그림의 제목은 심우(尋牛), 즉 '소를 찾다'입니다.
이 세계라는 초원 속에서 소를 찾아 갑니다.
그 소가 내 마음인지, 아니면 나 그 자체인지, 아니면 그 어떤 목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중요한 것은 그 소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 소를 잃어 버렸음을 알아야 소를 찾을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소'라고 해봐야 별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온 재산을 '황금 소'로 저축해 두었는데 그 황금 소를 잃어 버렸다고 합시다. 얼마나 당혹스럽고, 근심스럽고, 찾으려는 조바심이 잃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황금 소와 당신 자신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당신이 그토록 소중해 하는 ‘당신’이 무엇인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세파 속에, 온갖 근심과 걱정 속에, 분노와 격정 속에서 당신, 자신이 불탑니다. 왜일까요? 그런 것들을 건너 뛸 순 없을까요? 과연, 당신은 그런 생각조차 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그 허전함을 느낄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잃어 버렸음을 자신도 은연중에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소를 찾아 갑니다. 끝없이 펼쳐진 감각의 숲을 헤치기도 하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름 모를 강도 따라가곤 합니다. 그러다 저 멀리 부르는 나 자신, 거짓일지도 모르는 그 자신에 집착하다 결국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힘이 다하여 걸을 기운조차 없습니다. 주위엔 찾는 소는 보이지 않고 들리는 것은 다만 어두운 밤 숲에서 부(富), 권력, 명예의 소리만 가득합니다.
어디를 가야 소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마음은 작용하는 바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번도 소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다만, 자기의 참된 본성을 잠시 잊은 까닭에,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감각의 혼란함 가운데 우리는 소의 발자취마저 잃어 버렸습니다.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한데 나의 앞에는 수많은 갈림길만이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길이 옳고, 어느 길이 그른 길일까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나를 휘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 그림의 제목은 견적(見跡)입니다.
말 그대로 흔적, 즉 ‘소의 발자취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스승들이 없었던들 우리가 어찌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중국선의 초조이신 달마대사께서는 혈맥론에서 ‘스승을 찾아라. 스승을 찾지 않고서는 열의 하나도 성불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찌 스승이 사람뿐이겠습니까? 물론 참다운 스승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혜가대사와 같이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팔을 자르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위와 같은 스승도 소용없고, 만일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면 하다못해 길가의 잡초, 여기저기 뒹구는 돌, 쓰레기마저도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스승들의 가르침 아래 드디어 소 발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향기로운 풀밭에도 소 발자국이 있고, 마을에서 먼 깊은 산 속에도 소 발자국이 있습니다. 이 세속에도, 세속을 벗어난 출세간에서도 이 발자취는 그 어디에도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쇠붙이에서 여러 가지 기구가 나오듯이 수많은 존재가 내 자신의 내부로부터 만들어짐을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분별함을 무척 경계합니다. 불교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말입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분별도 분명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로 이르는 문의 하나입니다. 아직 진실의 문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오직 그 곳에 이르는 길만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세 번째 소 그림의 제목은 견우(見牛)입니다.
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햇볕은 따뜻하고, 바람은 부드러운데 강변 수양버들의 푸르름 속에서 우리는 꾀꼬리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감각에 몰입하다 보면, 우리의 6감작용 중에 마음의 움직임은 뚜렷합니다. 소리를 듣던지, 색을 보던지, 맛을 느끼던지 간에 우리는 그 근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육감(六感)에 몰입하자마자 이미 문에 들어섭니다. 그러니 이렇게 분명한 가운데 소가 숨어 있을 리 없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 묵직한 머리며 늠름한 뿔을 그린단 말입니까? 마음의 작용이 이렇듯 굳세고, 튼튼하며, 자명하니 어디로 들어가더라도 사람들은 소의 머리를 봅니다. 이 일치는 물속의 소금과도 같고, 물감 속의 색채와도 같습니다. 감각이 일어나는 곳에서 마음이 일어나니, 어떤 미미(微微)한 것이라도 자기 자신과 분리된 것은 없습니다.
참! 그리고, 이 열 마리 소 이야기는 범우사에서 나온 라즈니쉬의 "선의 십우도"란 제목의 강의록 '잠에서 깨어나라'란 책에서 기본 틀을 따왔습니다. 그 책에서는 곽암선사의 주해를 라즈니쉬의 독특한 해석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 자신의 생각을 조금 섞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열 마리 소 이야기는 곽암선사, 라즈니쉬, 저 이렇게 세 사람이 공동으로 쓴 셈이랄까요? 하여간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위의 책을 함께 보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드네요.
열 마리의 소 중 네 번째 소 이야기.
그림의 주제는 득우(得牛), 즉 ‘소를 잡다’가 되겠습니다.
처절한 마음과의 사투, 끊임없는 수행의 격함, 이러한 격렬한 추격 끝에 우리는 간신히 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성품이 본래 집착하고 흐르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에 그의 굳센 의지와 힘은 무진장합니다. 마치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듯, 자아의 집착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구름바다 저 멀리 높은 고원으로 돌진하여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가파른 골짜기 위에 그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결단코 한 발을 내 딛습니다. 그런 결심이 없고서야 그를 잡을 수 없으니까요. 그는 집착의 숲에서 오래 살았지만, 우리는 오늘에야 소를 잡았습니다.
사대(四大)와 오온(五蘊)의 풍경에 홀린 것이 그의 방향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는 마치 맛 좋은 풀만을 쫓듯, 좋은 감각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아직도 고집이 세고 제 멋대로이지만, 나를 따르려 하지 않는다면 수행과 고행, 마음의 억제라는 채찍을 휘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 마리 소 이야기 중에 다섯 번 째인 목우(牧牛)인데요.
한 마디로 ‘소를 풀 먹이다’가 되겠지요.
어제 드디어 우리는 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황소가 어찌나 억세고 힘이 센지, 채찍과 고삐는 꼭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그동안 길러온 습(濕)이 얼마나 강한지 때론 마음의 억제와 고행을 통해 끊임없이 마음을 길들이는데 정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 소는 어떤 진흙탕, 어떤 삼독(三毒)과 유혹 속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길을 잘 들이면 그 소도 자연히 점잖아지겠지요. 그때에는 고삐를 풀어줘도 주인을 잘 따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뗏목의 비유로, 부처님의 가르침도 적당한 때에 이르러서는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의 사념이 떠오르면 또 다른 사념이 떠오릅니다. 첫 번 째 사념이 깨달음으로 용솟음칠 때,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념들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첫 번 째 사념이 어리석음과 분노, 그리고 탐욕으로 일어나면 사람은 모든 것이 거짓이 됩니다.이러한 미망(迷妄)들은 어떤 객관성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관성의 결과입니다. 코뚜레를 꽉 붙잡고 어떤 의심도 허락지 말아야 합니다.
법화경 여래수량품 제16, 구원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지혜로운 자여! 여기에 의심을 내지 말라. 여래의 말은 진실이고 헛됨이 없나니…. ”
라고 말이죠
여섯번째 소이야기, 기우귀가(騎牛歸家)
즉,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가 되겠지요.
우리는 천신만고 끝에 겨우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에 채찍과 고삐도 달았습니다. 이제는 그 소를 타고 느릿느릿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먼 여행을 했습니다. 밖에서 무던히 헤매기도 하고, 마음의 끝에서 절벽에 떨어지는 아득함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투쟁은 끝났습니다.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잃은 것도 없습니다. 아니 본래 그러한 것들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산골 나무꾼의 노래를 부르며 어린이의 동요를 연주합니다. 나의 피리소리가 저녁놀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소 등에 걸터앉아 저 푸른 하늘 속에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손으로 퉁기면 울려 퍼지는 무한한 화음, 이렇게 나는 자연과 함께 합니다. 나는 이 무한한 음률을 지휘합니다. 누구라도 이 피리소리를 듣는다면, 내 노랫가락 속으로 뛰어 들어올 것입니다. 나와 함께 호흡하고 춤을 추겠지요. 하지만 누군가 뒤에서 날 부른다면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자아의 속삭임도,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불꽃이 다시 나에게 타오르려 해도 난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단언하건데, 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저 무한한 화합과 고요한 세계로….
일곱번째 소이야기, 망우재인(忘牛在人) 편입니다.
한 마디로, 소는 잊고, 사람만 남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제 소등에 걸터앉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우리는 무척 고요합니다. 소 또한 편히 누워 있습니다. 만족의 기쁨, 지복(至福)의 잠 속에서 드디어 새벽이 왔습니다. 이제 때가 왔으니 우리는 채찍과 고삐를 다 내버리고, 초가집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의 법칙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주제로 소를 택했을 따름입니다. 그것은 토끼와 덫, 혹은 물고기와 그물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금덩어리와 찌꺼기 혹은 구름 속에 가리워졌던 달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줄기 환한 달빛이 끝없는 시간을 통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임제선사의 손님은 빼앗고 주인은 남는 경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덟번째 소 이야기, 인우구망(人牛俱忘) 편입니다.
인우구망이란 즉 사람도 소도 완전히 잊었다는 말입니다.
채찍, 고삐, 사람 그리고 소….
모든 것이 무(無)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무(無)는 바로 한계가 없음이요, 모든 편견과 벽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이 하늘은 너무도 광대하여 어떤 메시지도 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 의심, 분별, 차별과 같은 눈송이들이 활활 타는 여실한 지혜의 불 속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수많은 스승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이제 범용한 것은 사라졌습니다. 마음은 한없이 한없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깨달음 같은 것은 찾지 않습니다. 또한 나에게 깨닫지 못한 어떤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태에도 머물지 않아 눈으로는 나를 볼 수 없습니다. 백 마리의 새가 나의 길에 꽃을 뿌린다 해도 그러한 찬미는 무의미합니다.
임제선사의 주인도 손님도 모두 빼앗은 자리는 바로 이러한 곳으로 나아감이 아닐까요?
열 마리의 소 이야기 중 아홉 번 째 시간으로 반본환원(返本還源)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반본환원이란 ‘근원으로 되돌아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근원으로 되돌아오기 위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또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때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귀머거리나 장님이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집에 살게 되어 그 무엇도 꺼릴 것도 없는 이 소중한 나를 찾은 것 이상의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강은 잔잔히 흐르고 꽃은 빨갛게 피어 있는 그대로의 여실한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진리는 맑디 맑습니다. 고요한 마음의 평정 속에서 나는 나타나고 사라지는 모든 형상들을 바라봅니다.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꾸밈도, 성형(成形)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은 녹색, 산은 남색. 나는 나타나고 있는 것과 사라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임제선사의 손님도 주인도 모두 놓아진 자리가 이러한 것이 아닐런지요.
열 번째 소 이야기의 제목은 '세상에서'입니다.
맨발에 가슴은 벌거숭이, 나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삽니다. 옷은 누더기, 때가 찌들대로 찌들어도 나는 언제나 지복으로 넘쳐흐릅니다. 나는 마술 같은 것을 부려 삶을 연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무들이 싱싱하게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 문중(門中)에 속하는 천 명의 현자들도 나를 몰라봅니다. 내 정원의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스승들의 발자취를 찾아야 한단 말입니까? 술병을 차고 시장바닥으로 나가 지팡이를 짚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술집과 시장으로 가니, 내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도(道)를 세상에 돌리니, 남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연꽃의 아름다움도 몸으로 보여 줍니다.
보화스님의 요령소리만이 저 하늘에서 은은히 울려옵니다.
[출처] 십우도(十牛圖) 해설 입니다.|작성자 덕우 오성
http://cafe.daum.net/w12836/2lYH/76
해드림 이승훈 출판과 문학 발행인 해드림출판사 대표 수필집[가족별곡](2012) [외삼촌의 편지] [국어사전에 있는 예쁜 낱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