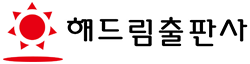다랑논-목성균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다랑논
목성균
올망졸망 붙어 있는 다랑논 배미들을 보면 흥부네 애들처럼 가난하고 우애 있어 보인다.
나는 어려서 팔월 열나흘 저녁때면 쇠재골 다랑논 머리에 서서 추석차례를 지내러 오시는 작은 증조부를 기다렸다. 그 어른은 칠십 노구를 지팡이에 의지하시고 훠이훠이 쇠재고개를 넘어오셨다.
나는 저문 산골짜기에 혼자 서 있었다. 그래도 무서운 줄을 몰랐다.
막 저녁 세수를 한 산골 처녀의 맨 얼굴 같은 들국화 꽃, 조용히 귀 기울이면 들리는 열매가 풀숲을 스치며 떨어지는 소리, 미쳐 어둡기도 전부터 울어대는 풀벌레 소리-. 나는 그 가을 정취에 취해서 무섭지 않은 줄 알았다. 그러나 좀 더 철이 들고 나서 알았지만 내가 무섬증을 느끼지 않고 조신하게 저문 산골짜기에 혼자 서 있었던 것은 가을 정취 때문이 아니라 다랑논 때문이었다.
아무도 없는 다랑논에서 나는 늘 인기척을 느꼈다. 배코친 머리처럼 깨끗한 논둑, 피나 잡풀 하나 없이 오로지 벼 포기만 서 있는 논 다랑이의 정갈함에서 방금까지 사람이 있던 기척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한 번도 논둑이 수북하게 풀숲에 덮여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미발진(여물지 않은) 벼이삭이 고개를 못 숙이고 노랗게 조락(凋落)하는 해도 있었지만, 그때도 논둑은 깨끗이 벌초가 되어 있었고 논배미 안에는 잡풀 하나 없이 벼 포기만 오롯이 서 있었다. 아쉬움같이 푸른 기가 아련한 연노랑 색의 여린 벼 포기가 고개를 못 숙이고 있는 것을 보면 농부가 아닌 어린 나도 마음이 아팠다. 허지만 깨끗하게 깎아 놓은 논둑을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농부의 마음이 엿보여서 다랑논 논배미 어딘가 농부가 저무는 것도 모르고 아직 엎드려서 일에 골몰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작은 종증조부는 대중없이 고개를 내려오셨다. 어느 해는 해그늘과 같이 내려오셨고, 어느 해는 열나흘 달이 뜬 후 휘영청 밝은 달빛을 밟고 내려오셨다. 나는 다랑논 머리에 서서 침착하게 그 어른을 기다렸다.
마침내 갈참나무 숲이 끝나는 고개 아래 그 어른의 하얀 모습이 나타나면 반가움에 목이 메였다. 나는 달려가서 그 어른 발밑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 어른은 지팡이로 노구의 피로를 바치고 서서 내 절을 받으셨다.
그리고 다랑논의 작황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누가 지은 농산지, 꼭 맘먹고 담은 가난한 집 밥사발 같구나"
신록이 우거지는 초여름, 다랑논을 본 적이 있다.
모내기 준비를 끝낸 다랑논은 참 깨끗했다.
가래질을 해서 질흙으로 싸 발라 놓은 논둑이 마치 흙손으로 미장을 해 놓은 부뚜막처럼 정성이 느껴졌다. 차마 신발을 신고 논둑길을 건너가기가 죄송할 지경이었다. 골짜기의 적은 물을 허실 없이 가두려고 정성을 다해서 논둑을 싸 바른 것이다.
물을 가득 잡아 놓아서 거울 같이 맑은 다랑논에 녹음이 우거진 쇠재가 거꾸로 잠겨 있었다. 뻐꾸기, 꾀꼬리, 산비둘기의 노랫소리가 다랑논에 비친 산 그림자에서 울려 나오는 것 같았다. 송홧가루가 날아와서 논둑 가장자리를 따라 노랗게 퍼져 있었다. 조용히 모내기를 기다리는 다랑논이 마치 날 받은 색시처럼 다 받아드릴 듯 안존한 자세여서 내 마음이 조용히 잠기는 것이었다.
첫눈이 내릴 듯 하늘이 착 가라앉은 겨울날, 거둠이 끝난 다랑논을 보면 지푸라기 하나 흩어 놓지 않고 깨끗하게 비워 냈다. 손바닥만큼씩 한 다랑논 논배미에서 마치 공양을 마친 바리때처럼 마음 한 점까지 다한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결코 농부의 마음에 차는 거둠을 못한 게 분명한 논바닥에 하등의 아쉬움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 소박하고 알뜰한 수확의 자리-. 포기를 벌지 못한 안타까운 벼 그루터기의 오열(伍列) 상태가 눈물겹도록 질서 정연했다. 무엇이 그리 고마웠을까. 얼마나 따뜻하고 간절한 마음이었을까. 못줄을 띄우고 눈금에 벗어나지 않게 한 포기씩 꼭꼭 모를 꽂고 성의껏 가꾸고 거둔 자리가 오두막집 자친 밥솥 아궁이처럼 사람의 온기로 따뜻했다.
농부의 바램에 미치지 못한 수확의 흔적-. 미안스러운 듯한 토지의 모습, 그러나 비굴하거나 유감스러운 기색을 느낄 수 없는 담담한 빈 겨울 논이 내 마음을 한없이 평온하게 해 주었다.
나는 젊은 날 마음이 격앙되면 쇠재골로 다랑논을 보러 갔다. 다랑논은 언제나 내 마음의 갈등을 가라앉혀 주었다. 빈 논은 빈 논인 대로, 모가 심겨 있으면 모가 심겨 있는 대로, 풍작이면 풍작 인대로, 흉작이면 흉작인 대로, 다랑논에서는 항상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다. 다랑논이 욕심 없는 사람처럼 '착하고 부지런히 사는 끝은 있는 법이여-.' 다독다독한 말 한 마디를 간곡히 내게 들려주는 듯했다.
나는 사람 사는 것이 다랑논 부치는 일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다랑논을 보면 삶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말하는 게 얼마나 건방진 수작인가 싶다. 다랑논은 삶의 원칙 같다. 다랑논의 경작은 삶에 대한 애착의 일변도 같다.
그 비경제적(非經濟的)인 경작지는 이제 다 폐경(廢耕) 되고 다랑논을 부치던 사람들도 다 타계하고 없다. 그런데도 다랑논의 경작상황을 아쉬워하다니 누가 알면 '너는 우루과이 라운드도 모르느냐'고 나무랄 것 같다.
목성균 선생님 2004년 6월 27일 영면
작품집
명태에 관한 추억(문예진흥원 2003년 우수도서/하서출판)
생명(유고수필집-수필과비평)
해드림 이승훈 출판과 문학 발행인 해드림출판사 대표 수필집[가족별곡](2012) [외삼촌의 편지] [국어사전에 있는 예쁜 낱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