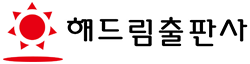밤을 달리는 열차-한흑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밤을 달리는 열차
한흑구
저녁 아홉 시, 서울을 떠나서 부산으로 달리는 밤 열차 속에 나는 자리를 하나 잡았다.
달도 뜨지 않은 캄캄한 밤을 열차는 한강을 건너자 소리를 지르면서 남(南)으로 달음박질을 하였다.
열차 안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교의(交椅) 하나에 세 사람씩 앉아서 서로 어깨를 비벼대고 있었다. 그러나 좁은 자리를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나의 옆에는 젊은 대학생이 타고 있었고, 또 창가에는 늙은 할머니가 타고 있었다. 맞은편 자리에는 안경을 쓴 이십대의 청년이 앉아서 희미한 불빛 아래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 옆에는 사십대의 신사 한 분, 또 그 옆에는 삼십대의 피부색 좋은 여인이 앉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캄캄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통로를 건너서, 나의 왼편 자리에는 노동복을 입은 삼십대의 젊은이가 둘, 그 옆 창가에는 보따리 장사꾼인 듯한 사십대의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 맞은편 자리에는 육십이 넘어 보이는, 수염이 흰 늙은 할아버지가 파리한 얼굴을 하고 가로누워서 가끔 기침을 쿨룩쿨룩 하였다. 늙은이가 누운 발끝에는 늙은이의 딸인 듯한 사십대의 시골 여인이 늙은이의 등을 어루만져 주고 있었다.
기차는 어느덧 천안역을 지나서 조치원으로 향하여 달리고 있었다. 밤은 깊어서 기차 바퀴가 더욱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달카닥 달카닥…….”
단조로운 소리였다.
“따스한 벤또(도시락)가 나왔습니다. 시장한 손님에게 따스한 벤또가 나왔습니다.”
도시락 장수가 나타났다.
“나 하나 주시오.”
맞은 자리에 앉아 있던 뚱뚱한 신사가 오백 원짜리 하나를 꺼내었다.
“나도 하나 주세요.”
그 옆에 앉아 있던 三十대의 피부색 좋은 여인도 하나 받아들었다.
통로 건너편 맞은 자리에 누워 있던 늙은이는 또 기침을 시작하였다.
“케힘…, 헤케힘…….”
딸인 듯한 시골 여인은 일어나려는 늙은이의 허리와 등을 받들고 손수건으로 늙은이의 입을 닦아주었다.
늙은이는 “에헤음!” 하고 한숨을 쉬고, 또 다시 자리에 눕자 희멀건 눈으로 시커먼 차창을 내다보았다.
“아직 병이 낫지 않았는데 왜 퇴원을 했어요? 잘 고치고 나오지.”
맞은편에 앉아 있던 장사꾼인 듯한 사십대의 여인이 딸인 듯한 여인에게 물었다.
“병원에서도 무슨 병인지 모른다요.
석 달이 되었어도 안 낫는 걸……. 돈도 없고, 죽어도 집에 가서 죽는다요!”
늙은이의 딸은 기운 없이 대답하면서 새끼손가락으로 눈시울을 문질렀다.
늙은이는 또 기침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뼈만 남은 흰 손을 차창 가로 내둘렀다.
“가만히 누워 계세요. 다리를 이리로 뻗으시고, 병을 완전히 고치시지도 않고!”
장사꾼인 듯한 여인은 친절하게 말하면서 늙은이의 다리를 자기 옆으로 걸치게 하였다.
“죽어야지! 집에 가서 죽어야지!”
늙은이는 혼잣말 같이 거쉰 목소리로 말하며 또 캄캄 어두운 차창을 쳐다보았다. 창 위에는 달도 별도 새벽놀도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기차는 쉬지 않고 칙칙 펑펑 소리를 내며 천천히 기어 올라갔다. 언덕을 넘고 굴을 뚫고 추풍령 고개를 올라가는 모양이었다. 옆에 앉은 대학생도 늙은 할머니도 다 숨소리도 없이 교의에 기대서 잠이 들어 있었다. 맞은편에 앉아 있는 이십대의 청년은 입을 있는 대로 벌리고 고개를 꺾은 채 수그려져 잠을 자고 있었다. 신사도 여인도 다 머리를 맞대고 잠을 자고 있었다. 통로 옆에 있는 노동자 두 사람도 장사꾼 여인도 늙은이의 딸도 다 고개를 숙이고 잠들고 있었다.
시계는 밤 두 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혼자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늙은이의 희멀건 눈이 띄어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의 턱에 매달린 흰 수염을 나는 말없이 바라보았다.
“죽어야지! 집에 가서 죽어야지!”
금방이라도 또 늙은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할 것만 같아 보였다.
기차는 아직도 숨이 가쁘게 어두운 밤의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다. 칙칙 펑펑 언덕을 기어오르고 산의 굴을 뚫으면서 아직도 추풍령 고개를, 우리나라의 지붕인 추풍령 고개를 넘어가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이북에 있는 나의 집을 한 번 다시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러나 기차는 아직도 숨찬 소리를 내면서 추풍령을 넘어 남으로 달리고 있었다.
달도 별도 새벽도 없는 캄캄한 밤을 기차는 그냥 내달리고 있었다.
해드림 이승훈 출판과 문학 발행인 해드림출판사 대표 수필집[가족별곡](2012) [외삼촌의 편지] [국어사전에 있는 예쁜 낱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