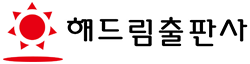잊어라 잊어라 했을까_임병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한국문학신문 제14회 문학상 수상작품(수필 대상)
잊어라 잊어라 했을까
_임병문
한낮인데도 공원으로 가는 길목의 약수터에는 적막이 감돌았다. 이어지는 설한으로 인적이 끊어진 탓이다. 고요한 약물터의 뜨락에는 어젯밤 내린 눈이 아직 숫눈인 채 쌓여있다. 가만히 다가서 수줍게 눈을 밟아본다. 은밀한 그 느낌에 가슴이 설렌다.
설레는 가슴은 새 눈이고 숫눈이어서가 아니다. 이미 내려서 묵은 눈도 내게 새로운 느낌의 만남이면, 그것은 가슴 떨리는 첫 만남이기 때문이다. 밟는 나도 품어주는 눈도 서로의 마음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득 나목(裸木)에 앉은 새 한 마리가 자리를 박차고 난다. 새가 떠난 가지 끝의 눈은 분분히 흩어져 날리고, 거기에 붉은 꽃 한 송이가 피어있다. 괴괴한 마당 한쪽에 그림처럼 피어난 선홍빛의 알 수 없는 꽃이다. 고결한 듯 그윽하고, 미혹한 듯 은은한 자색이 꽃 속에 기품으로 서려있다.
아! 그것은 붉게 핀 한 송이 매화였다. 좀체 볼 수 없는 한 떨기 설중매인 것이다. 생각에 잠긴다. 숫눈과 홍매화, 그리고 나, 서로가 범상치 않은 인연이 되었다. 연(緣)이란 본시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눈이 녹고 꽃이 지고, 발길을 돌리면 우리의 만남은 헤어짐이 되고, 맺은 연은 끝이 날 것이다. 그 끝난 인연은 이별의 아픔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긴 그리움이 될 수도 있다.
내게는 일찍이 그런 그리운 사람이 있었다. 선연히 떠오르는 그 봄날, 오늘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 인연이 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내게 붉은 매화처럼 찬연히 다가와 선홍빛 그리움만 남기고 에둘러간 사람이다.
내 나이 열두 살, 그때의 봄날은 참으로 외로웠던 시절이었다. 시골에서 막 대처로 이사를 온 나는 갈 곳도 친구도 없었다. 그날도 나는 홀로 공원의 뒷산에 올랐다가 불량배를 만나 쫓기게 되었다. 넘어지고 구르며, 어른들이 보이는 산 아래 활터까지 와서야 그만 기진해 쓰러지고 말았다.
옷은 찢어지고 무릎과 손등에는 선혈이 낭자했다. 쫓아오던 낯선 형들은 보이지 않았고, 피 묻은 내 손에는 뺏기지 않은 새 하모니카가 꼭 쥐어져 있었다.
떨고 있는 내게 한 여인이 다가왔다. 그는 나를 부축하고 집에 들어가 뒤란의 우물가에 앉혔다. 그리고는 피를 씻어내고, 찬물로 얼굴을 식혀 주었다. 놀라서 몸을 떠는 나를 여인은 가만히 안아주었다. 왠지 눈물이 났고, 여인에게서 지분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밤꽃 향처럼 그윽하게 났다.
그날 이후 여인은 내게 운명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모르는 여인에게 얼굴을 붉히며 누나라고, 수줍게 불러본 날이 그날이기 때문이다. 그 외로웠던 어린 시절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 첫 정(情)의 소리, 바로 누나였던 것이다.
그날 나를 데리고 들어가 피를 씻어 주고 약을 발라 주었던 활터 아래 그 큰 기와집에서 누나는 살았다. 사람들이 그 집을 화류(花柳) 집이라 부르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들었고, 비로소 그 예쁜 누나가 어쩌면 기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혼자서만 하게 되었다.
진달래가 무더기무더기 흐드러지던 어느 봄날, 나는 누나를 찾아갔다가 그 화류집 담장 아래서 누나의 낭랑한 노랫가락을 처음으로 들었다. 숨이 막히도록 그 소리가 좋았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알 수 없는 가야금 소리는 내 어린 가슴에 누나를 그만 대못 질러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누나를 따라 뒷산에 올랐다. 아! 산은 두견 빛으로 무리무리 발갛게 익어가고, 흐드러진 진달래는 만산에 꽃 세상을 펼쳐내고 있었다. 누나는 절로 노래를 불렀다.
“바위 고개 피인 꽃 / 진달래꽃은 / 우리 임이 즐겨 즐겨 꺾어 주던 꽃 / 임은 가고 없어도 잘도 피었네 / 임은 가고 없어도 잘도…….”
갑자기 노래가 끊어졌다. 누나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그 하늘 아래 고향 집이 있다고 했다.
이런 누나와의 꿈같은 시절이 봄을 지나 겨울로 가던 어느 날, 누나는 내게 말했다. 이제 찾아와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는 무언가를 내밀었다. 누나가 밤을 새워 뜬 벙어리장갑이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생이 되면 그때 나를 다시 찾겠다며 누나는 내 주소를 적었다. 그것이 이별이 되었다.
누나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때 누나는 왜 나를 안고 울었는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누나는 정이 많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뿐이다. 그런 누나를 향한 내 속절없는 그리움은 내 생에 긴 이별의 아픔이 되었다.
짧은 만남과 긴 이별, 나이 들어서도 잊히지 않는 그때의 이별과 그때의 슬픔, 언뜻 아홉 달의 짧은 인연 끝에 헤어져 평생을 서로 그리워하다가, 끝내 세상을 등진 퇴계(退溪)와 기생 두향(杜香)의 애절한 사연이 떠오른다. 한 사람이 죽어서야 비로소 만날 수 있었던 그들의 애달픈 사랑, 퇴계는 매화시첩(梅花詩帖)에 두향을 향한 그리움을 이 같은 시로 남겼다.
‘이별은 소리조차 나지 않고 / 살아 이별은 슬프기 그지없어라 / 서로 한번 보고 웃는 것 / 하늘이 허락한 것이었네 /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 봄날은 다 가려 하는구나.’
퇴계는 죽는 날 아침 두향이 보내온 분매(盆梅)를 바라보며 ‘매화에 물을 주어라.’ 하는 말을 남기고 저녁에 숨을 거두었다. 죽는 그날까지 두향을 못 잊어 한 것이다. 두향은 퇴계가 죽자 단양 땅 남한강에 스스로 몸을 던져 정인(情人) 곁으로 갔다.
사무쳐 잊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어쩌면 그것은 삶의 업(業)인지도 모른다. 피할 수 없는 욕망의 업일지도 모른다. 그 처절한 그리움의 고통, 정녕 어찌해야만 하는가.
누나가 세상 어디에서 나를 아직 생각하고 있다면, 누나는 이런 내게 무어라 말을 했을까. 사람의 인연이란 본디 그런 것이니 이제 그만 잊어라 잊어라 말을 했을까.
겨울 공원의 동상으로 서 있는 퇴계는 눈 속의 매화를 바라보며 아직도 두향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도 누나처럼, 이제 그만 잊어라 잊어라 두향에게 그리 말을 했을까.
해드림 이승훈 출판과 문학 발행인 해드림출판사 대표 수필집[가족별곡](2012) [외삼촌의 편지] [국어사전에 있는 예쁜 낱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