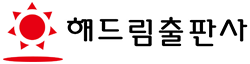수필 수필가가 되고픈 수필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판암 댓글 1건 조회 736회 작성일 22-10-17 14:46본문
수필가가 되고픈 수필가
글을 쓴답시고 컴퓨터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자판 두드리기를 즐긴다. 하지만 글로 밥을 버는 전업 작가와는 격과 결이 사뭇 다른 이름 없는 장삼이사의 충수꾼으로서 글 농사를 짓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어정잡이일 따름이다. 애초부터 다부진 결기를 다짐하며 매달렸음에도 재능이 부족한데다가 게으른 천성 때문에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났어도 글 동네의 변방 언저리를 겉돌지라도 서럽다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의 후작(後作)으로 택한 일에서 폐농(廢農)일지라도 도전하고 싶고 잘 할 수 있으며 걷고 싶은 길을 가는 기꺼운 여정이기 때문이다.
수필을 겨냥해 넌지시 넘겨다보며 문학지의 신인상에 공모에 참여했던 게 벌써 스무 해째에 접어들었다. 지천명(知天命)의 중반 무렵 정년 이후에 수필과 연분이 나서 눈에 띄는 문예지 두 곳에 신인상 공모하여 당선이라는 절차를 거쳐 글쟁이의 외형적인 자격을 갖추는 요식절차를 마무리 했다. 그 후 애정을 가지고 천착(穿鑿)을 거듭해왔지만 타고난 재능이 따라주지 못하고 절절한 노력이 턱없이 모자랐나보다. 그 때문일까. 여태까지 어연번듯한 결실 하나 없이 빈 쭉정이만 손에 움켜쥔 채 세월만 갉아 먹은 모양새이다. 그런 까닭에 누구나 반길 반듯한 작품의 기대는 백년하청으로 허황된 꿈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영 자신이 없다.
민족상잔의 전쟁이라는 6.25를 겪던 질곡의 세월에 성장하며 배움을 지속했던 불행한 세대로서 문학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거의 없었다. 그런 때문에 중고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지금도 뇌리에 강열하게 각인 되었다. 그 시절 교과서나 주위에서 접했던 수필 중에 김진섭의 “백설부”, 이양하의 “신록예찬”, 피천득의 “인연”, 민태원의 “청춘예찬” 등이 언뜻 떠오른다. 아울러 안톤슈낙(Anton Schnack)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도 생각난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수필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이나 앎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풀어낼 수 있다는 점에 매료되어 지속적으로 가까이 접해왔던 까닭에 친근해져 이 세계에 발을 내디뎠지 싶다.
온갖 궁리를 해봐도 현재 가장 잘 할 수 있고, 즐겁고 보람된 일이 글 쓰는 작업이다. 여기에 몰입하면 잡다한 일상을 잊어 평화롭고 이런저런 제약이나 간섭이 없으며 사념의 세계에 푹 빠질 수 있다는 안도감에 더더욱 정이 간다. 이런 이유에서 일터에서 내려선 뒤에 거의 매일 매달리는 일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동네 뒷산으로 왕복 10km 남짓한 노정의 등산이다. 이에 버금가는 즐거움이 글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일이다. 이들 둘 중에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낙(樂)이고 보람으로 요즘을 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외형적인 얻음일까.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 한편 그동안 썼던 글을 모아 펴낸 수필집이 여러 권이다. 하지만 냉철하게 따져보면 겉으로 풍성하게 비춰지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텅 빈 상태로 외화내빈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금만 파고 들면 제대로 된 글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상태로 너무 부실해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꽁꽁 숨겨두고 싶다.
같은 책을 출판하는 데도 사정은 완전히 반대였다. 대학에서 전공서적을 30여권 집필했었다. 그 때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면 원고료와 함께 출판한 뒤에 판매 부수(部數)에 따라 매년 꼬박꼬박 인세를 통장으로 입금해 줘서 그 수입이 쏠쏠했다. 그런 까닭에 출판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글쟁이가 허접한 수필집을 발간할 때마다 출판비 부담은 상당한 골칫거리였다. 그것도 한두 권이 아니고 무려 17권에 대한 출판비 조달 문제는 녹록치 않았다. 연금으로 삶을 꾸려가는 퇴직자이기에 책이 출간될 때마다 출판사 사장과 아내의 눈치를 봐야하는 고약한 처지로 전락하는 게 내키지 않았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게 마련이던가. 고맙게도 지금까지 아내는 콩켸팥켸 따지지 않고 무언의 응원을 보내주며 모르는 척 넘겨줬다. 하지만 앞으로도 몇 권의 책을 더 출간할지 몰라 편편치 않다.
글 동네에서 마주했던 낯설고 어색했던 문화의 단면이다. 소위 ‘등단’ 이후에 거의 활동이 없어 변변한 작품 한편도 없는 처지에 연조(年祚)가 오래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원로 대접을 받으려드는 이상한 문화가 무척 낯설고 동의하기 어려웠다. 물론 연장자로서 대접은 별개의 문제이다. 한편 다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이들이 뒤늦게 문단에 발을 들이민 신출내기 주제에 대가(大家)인체 거드름을 피우며 군림하려 드는 몰염치는 어불성설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런 맥락에서 ‘작가란 나이의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작품으로 평가받아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게 합당하다’는 평범한 진리가 하루 빨리 상식으로 똬리를 틀기를 염원한다.
등단 이후에 적지 않은 책을 출간해냈음에도 제대로 된 글 하나 쓰지 못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터무니없는 꿈을 접고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게 현명한 대응이고 정답이리라.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이 따르지 않아 미련퉁이처럼 오늘도 글에 목을 매고 컴퓨터와 씨름을 거듭하는 내가 정상일까. 그런데 이름 없이 어정잡이 글쟁이로 살아왔건만 가는 세월의 쌓임에 연유하는지 모르겠다. 이따금 이런저런 문연(文緣)으로 이어진 이들이 어떤 단체나 개인의 지지에 대한 연대서명이라든가 특정한 이슈나 사안에 대해 견해를 피력하는 합동성명을 낼 요량인데 동참해 달라는 연락이 온다. 그럴 때면 정중히 거절한다. 왜냐하면 글 동네에 겨우 발붙이고 있는 터수에 어림도 없는 행동이라는 같잖은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다.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거망동은 자멸의 길이며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단호히 내치려든다. 이럴 경우에 처하면 봄꽃의 우두머리라고 하여 화괴(花魁)로 불리는 매화를 예찬한 말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예로부터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을 팔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매일생한불매향(梅一生寒不賣香)라고 이르며 참다운 자성을 일깨웠다.
흔히들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마음가짐에서 앞으로 맞을 10년쯤까지 도를 닦는 심정으로 절실하게 매달리다 보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올곧은 수필 한편이라도 건지는 행운을 누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리되려면 언필칭 수필가가 아니라 ‘수필가다운 수필가’로 거듭나는 각고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터인데 그런 열정과 끈기와 재능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다. 어찌되었던 황혼의 세월에 갈 수 있는 단 하나 뿐인 외길이기에 호불호에 관계없이 걸어할 운명이기도 하다.
현대작가, 제13호, 2022년 9월 23일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댓글목록
박래여님의 댓글
박래여 작성일
선생님, 저는 그냥 씁니다.
글을 쓰고 있을 때가 가장 좋아서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지만 글을 쓸 때는 몰입하니까요.
어떤 때는 적나라하게 저를 내보여 부끄럽기도 합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