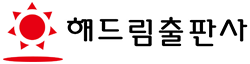소설 그 집에 앉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래여 댓글 2건 조회 591회 작성일 22-07-30 09:06본문
손바닥 소설
그 집에 앉아
박래여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가 나무의자에 앉았다. 삐걱거리는 의자도 노인만큼 낡았다. 노인은 건너편 산을 바라본다. 햇살이 다복한 건너편 산은 처녀의 봉곳한 젖무덤 같다. 그는 할멈 생각에 울컥한다. 쭈글쭈글한 젖무덤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그 가슴에 얼굴을 묻을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랴.
한때 다라마을은 그의 왕국이었다. 옛 다라국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은 컸다. 그와 달리 까마득한 날부터 할멈의 윗대는 그 문중의 종이었다. 수세기가 지났지만 다라마을에 면면히 흐르는 구전이 있다. 사랑해서는 안 될 관계가 양반과 종의 관계다. 신분의 격차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서도 안개처럼 깔려있는 핏줄의 내력을 노인은 무시할 수 없다.
‘할멈, 당신 없는 이 곳은 사막 같소.’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진다. 노인은 햇살이 포실한 동네를 내려다보며 감회에 젖는다. 한때 그는 가문의 영광이 되고자 한양 땅을 밟았다. 고향의 집과 논밭을 팔아치우고 부모님을 서울로 모실 때만 해도 왕손의 기백이 있었다. 쇠락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왕손의 후손답게 떵떵거리며 귀향하고 싶었다, 아니, ‘너랑은 안 돼.’ 냉정하게 그를 밀어낸 그녀에게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임시에 아내는 죽고 자식과 등을 지고 후줄근해진 육신을 의탁할 곳이 없었다. 빈손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스며들 수도 있었지만 ‘꼭 한번 만 보고 오자. 먼발치에서라도.’ 그는 그녀와 고향을 하나로 생각했다. 사실 서울 생활에 젖어 살 때는 까마득히 잊었다. 돈이 있을 때는 흥청망청 잘 놀았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는 늙어버린 자신을 발견했다. 어디에도 의탁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불현 듯 다라마을이 생각났다. 귀소본능이라고 하던가.
그때도 봄이었다. 새싹이 파릇파릇 돋고 있었다. 그는 여든이 넘은 노인이었다. 그가 다라 읍에 내렸을 때는 황혼 무렵이었다. 다라고분군이 마지막 햇살을 받으며 그를 내려다봤다. 자신의 행색이 참으로 초라했다. 이런 몰골로 어떻게. 돌아갈까. 그래도 보고 가자. 결심했다. 다라마을로 가는 다리를 건넜다. 뒤틀리고 괴기스러운 고목 두 그루가 그를 반겼다.
“다 저녁인데 오데서 오시는 분이오?”
거기 마을 정자에 앉아있던 할멈이 구부정한 허리를 펴며 말을 붙였다. 여든은 넘음직한 할멈이었다. 생각지도 않던 말 상대를 만났다는 것이 반가워서 서둘러 다가갔다.
“저 마을에 사시오?”
“그렇소만”
“혹 저 동네에서 태어나 자란 순남이를 아시오?”
“영감님과 어떤 관계요?”
그는 말문이 막혔다. 어려서 알던 친구라고 해야 할까.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던 할멈이 ‘따라오소.’하면서 앞장섰다. 할멈과 천천히 들길을 걸었다. 마을에 들어섰다. 마을은 괴괴했다. 어디에서도 사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안 사는 걸까. 그는 슬그머니 오한이 왔다. 어려서 다라마을은 귀신들의 놀이무대라고 했다. 다라 국은 신라에 의해 멸망하면서 지배계층은 능선 어딘가에 순장으로 묻혔다고 들었다. 할멈은 가파른 골목 끝집으로 들어갔다.
“아직 마루가 따뜻하지요. 앉아 계시구려. 군불 지피고 저녁 같이 드십시다.”
할멈은 부엌으로 사라졌다. 금세 향기로운 연기냄새가 나고 칼질 소리가 들렸다. 멍 때리기도 잠깐이다. 할멈은 개다리소반을 들고 나타났다. 거기엔 쌀밥과 시래기 된장국이 놓였다. 그는 염치불구하고 시래기 된장국부터 맛을 봤다. 폐부를 깊숙이 찔러오는 그녀의 손맛이었다. 순남이는 그의 집 식모였다. 가족은 행랑채에 살았다. ‘도련님, 도련님!’ 그는 신음했다. 어머니는 서둘러 그녀의 혼처를 마련했다. 계집종에게 눈독 들이는 외아들을 한양으로 떠나보내기 위한 묘책이었다.
“이 맛을 잊지 못했는데. 당신 누구요?”
그녀는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 너머 가물거리는 얼굴 하나, 그에게 각인된 모습, 꽃봉오리처럼 활짝 핀 순남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마법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꿈인가. 분명 꿈은 아니었다. 그는 할멈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정지용 시인은 옛이야기 지절대는 곳이 고향이라고 했던가. 노인과 할멈은 세월의 강을 훌쩍 건넜다.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겉모습은 황혼이지만 마음은 청춘이었다. 할멈 역시 부산에서 생활하다 남편을 먼저 저승길 보내고 폐가로 버려져 있던 친정으로 돌아온 지 몇 해 됐단다.
“나도 들어오고 싶은데 어디 헌 집 한 채 구할 수 없소?”
“길 건너 끝집은 청소만 하면 쓸 만 하요. 할멈이 지난해 갔거든.”
그렇게 하여 노인은 할멈과 길을 사이에 두고 아래위에 살게 되었다. 할멈도 노인도 서로에 대해 애틋했다. 오누이처럼 서로에게 의지하며 세월을 낚았다. 이제 할멈은 갔다. 임인 년 춘삼월에 건너편 산 능성이 그의 선산 귀퉁이에 묻혔다.
노인은 할멈의 집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자네 오고 있는가?’ 노인의 눈에 물기가 어린다. 안개처럼 뿌연 연기가 할멈의 집 굴뚝에 피어오른다. 할멈이 삽짝에 들어선다. ‘영감, 오세요. 밥상 차려놨으니 와서 묵소.’ 노인은 ‘자넨가. 자네 왔는가?’ 노인은 할멈의 손을 잡고 휘적휘적 삽짝을 나간다. 따뜻한 햇살이 노인의 등에 앉아 쓰다듬는다. 두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은 기도하는 자세로 숨을 거두었다.
2022. 5. <2022. 월간 기업나라 5월호>
댓글목록
한판암님의 댓글
한판암 작성일우리는 흔히 많은 것을 가졌을 때는 그 소중한 가치를 깨우치지 못하는 우를 범하다가 잃고 나서 진정한 가치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흔한데..... 두 노인의 얘기에 엉뚱하게도 어린 청소년들의 만남 이야기 였던 황순원의 "소나기"가 떠올라 생각에 잠기기도 했답니다. 문자 그대로 "손바닥 소설" 이기에 짧으면서도 응축된 사연과 세월을 유추하며 행간에 도도히 흐르는 맥을 깊이 생각하며 감상했습니다. 삼복의 무더위 건강하고 보람되세요
박래여님의 댓글의 댓글
박래여 작성일
선생님, 고맙습니다. 소설을 쓰고 있으면 그 속에 빠져 현실을 잊어요.
소설은 허구 속에 진실을 추구한다고 하지요.
소설 보다 더 소설 같은 현실 속 삶이 있지만 소설로 그려내는 세계에서 진실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무더위에 건강 단디 챙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