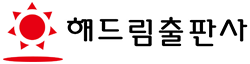- 사람이 그리운 섬
-
 김명희
김명희 -
 해드림
해드림 -
 2012-09-30
2012-09-30 -
 무선
무선 -
 97889-93506-51-8
97889-93506-51-8 -
 10,000원
10,000원






본문
펴내는 글
각자 섬으로 서 있는 다도해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다도해와
같습니다. 각자 섬으로 서 있고, 그 섬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푸른 바다에 하얀 선을 그리며 배들이 이 섬 저 섬으로 마실 다니며 사람들을 풀어놓기도 합니다. 세찬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어 놓고 가면, 파도들이 달려와 놀아줍니다.
그러다 어두운 밤이 되면 검은 바다에 몸을 담그고 온전히 혼자가 됩니다. 그래서 섬은 늘 혼자입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하지만 날이 밝으면, 바람이 지나가며 아는 체를 하고, 새들이 찾아와 동백섬의 동백이 얼마나 예쁜지, 돌섬 바위 사이에 있는 둥지에 알이 몇 개나 들어있는지, 허리가 휜 소나무가 얼마나 심심해하는지, 이 섬 저 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섬은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섬입니다. 사람이 그리운 섬.
소리 내어 옆 섬을 불러도 보고, 물속에 잠겨있는 팔을 들어 만져보고 싶은, 바닷물에 몸 담그고 체온을 나누고 싶은 섬입니다. 섬과 섬 사이에 다리가 이어지기도 하고 배가 사람을 태워 나르며 섬을 이어줍니다. 바로 관계이지요. 사랑과 관심이 섬과 섬을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요, 커다란 배입니다.
섬 하나하나가 모여 마을을 이룹니다. 한 하늘을 이고, 같은 바람을 끌어안고, 새도 품어주고 꽃을 피워내 나비도 맞아주는 아름다운 섬이 바로 우리들의 섬입니다.
섬 하나에 이야기 하나를 엮어 다도해 같은 글 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외롭다면 눈을 들어 옆에 서있는 섬을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걸어보세요. 그 섬도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김 명 희
펴내는 글: 각자 섬으로 서 있는
Ⅰ. 옥화
퍼즐 맞추기
자기 입을 속여 먹는 법
얘들아 놀자
실땅님
가르치며 배우며
옥화
물음표와 느낌표
얼쑤 잘 한다
별이 되고 싶은 아이
꿈이 없는 아이들
어머니
선생님
아저씨
Ⅱ. 참으로 지랄 맞은 세상
사랑과 감사의 물
흐르는 강물처럼
내 머릿속의 지우개
복주께
별 줍는 밤
전시된 아이들
양복에 삿갓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참으로 지랄 맞은 세상
사랑의 갈증
Ⅲ. 그로칼랭
호랭이
희한한 새
함께 나는 기러기
부엉이
천의를 걸친 서생원
소라게의 집
챔프-Ⅰ
챔프-Ⅱ
반려 견
잠자리의 파란 날개
그로칼랭
그들만의 세상
사발에 담긴 조청
3년을 30년처럼
추한 것도 아름답다
개똥밭에 굴러도
아직 핏기는 있어
그 여자와 그 남자
Ⅳ. 날 울린 남자
찬란한 역사와 슬픔이 흐르는
천년 고도의 도시
녹우당에서 만난 공재
수종사
떠나지 못한 자의 넋두리
영혼이 빛나는 영광
비사벌의 송현이
날 울린 남자
말 무덤
떠도는 영혼
사랑해
Ⅴ. 빈 물병과 감자
만년필
심벌즈와 트라이앵글
진정으로 함께 한다는 것
나는 얼마짜리
알차고 야무진 알밤처럼
노인과 바다
빈 물병과 감자
Ⅵ.물 위에 피어나는 등불
마음 말리기
망우초
능소화
꽃밭에서
은행나무
제비꽃 반지
호박 예찬
붉디붉은 감 같은 사랑
물위에 피어나는 등불
그늘나무
새 악시야 새 악시야
다른 시간 같은 인연
친구
·1958년 강원출생
·전KBS 아나운서
·2003년 범우사「책과인생」10월호 신인상 수필 수상으로 등단
·2009년 강서문학상수상
·수필집「희한한새」(해드림)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회원
·한국문인협회 강서지부 부회장
·테마수필 필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강서구협의회 부회장
·꿈꾸는 어린이 도서관 운영위원장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http://www.sdt.or.kr/
*‘어머 얘도 저렇게 웃을 때가 있네.’하고 생각은 했지만 친한 사이가 아니었기에 무심코 돌아섰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아이가 머리칼을 휘날리며 환하게 웃으면서 뛰어오던 모습이 지금까지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이다. ‘옥화’라는 다소 진부한 이름도 잊지 않고 있다.
분명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었으면서 자신을 스스로 묵언의 커튼으로 감쌌던 그녀. 그야말로‘색 바랜 해 말간 동백꽃’같은 그녀였다.
송자누나처럼 선생님께 자로 입을 맞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그녀의 입을 닫게 한 것은 아니었는지. 세상의 편견에 맞서기에는 너무 어린 그녀는 하고 싶은 말들을 가슴에 묻어버린 건 아닐까.
이제 그녀도 더 편안해진 모습으로 그날 내게 보였던 환한 웃음을 지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본다.
_‘옥화’ 중에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