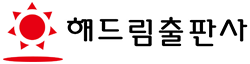- 은비늘 같은 시간
-
 임매자
임매자 -
 해드림
해드림 -
 2012-08-22
2012-08-22 -
 변형
변형 -
 978-89-93506-46-4
978-89-93506-46-4 -
 10,000원
10,000원




본문
아픔을 만지작거릴 때 보이는 것들
딸아이가 제 곁을 떠난 후 매일 마음은 숯불처럼 이글거려서 누군가를 향해 수탉처럼 발톱을 세워 할퀴고 싶었습니다. 저만의 그 열상(熱傷)을 내내 곱씹다가 시퍼렇게 날 선 말들로 툭툭 뱉어내면 좀 후련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치유 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저에게 글은 살아남기 위해 마셔야 하는 공기였습니다. 글을 쓰다보면 아이의 무게에서 벗어나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첫 작품집을 낸 후 2년여 동안 글을 쓰면서‘ 슬픔’이라는 단어를 무진장 쳐대니 나도 모르게 그만 그 슬픔에 감염되는 듯했습니다. 이 슬픔은 언제나 추수 끝난 빈들에 쌓인 볏단처럼 순하게 말라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작품집을 묶으면서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찬 작품을 많이 솎아냈지만, 그래도 어둠이 목까지 출렁이는 음습한 책이 되어 독자들로 하여금 축축한 어둠으로 몸을 적시게 할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조금은 밝고 따듯한 글을 쓰고 싶은데, 왜 이렇게 슬픔과 아픔으로 푹 젖어버리는지요? 동네 놀이터 그네에 앉아 사근사근하게 이야기하듯이 쉽고도 사려 깊은, 포근하고 따스한 글을 쓰고 싶은데, 왜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해 딱딱한 관념어를 늘어놓으며 비분강개하는 글을 쓰게 되는지, 그것은 제 눈에 유독 어두운 곳이 잘 보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렇게나마 제 상처를 치유 받고 싶어서일까요?
에덴동산에 있어도 혼자라면 즐겁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제게 절경은 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야말로 절경입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의 영혼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실감 납니다. 그래서 냉장고 귀퉁이 밀가루 반죽처럼 사람들 한 귀퉁이에서 말랑말랑하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음습하고 어두운 글일망정, 방금 베어낸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축축한 그늘과 얼룩을 서로 다독여가며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저 저 혼자의 아픔만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것은 낮고 어둡고 습하고 비좁은 틈새에서 꼼지락대면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박제가 된 날벌레, 길을 가로질러 질주하다 문득 서서 나를 바라보는 생쥐의 초롱초롱한 눈동자, 아스팔트 틈새의 풀꽃, 동양란이 살던 빈 화분에 살아있는 손톱만 한 푸른 이끼, 작고 앙증스러운 잡초들, 그것들은 예전부터 그렇게 이 땅에 배를 대고 납작 엎드린 채 잔뿌리들로 땅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티끌같이 작은 것들이 톡톡 건드리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풍경들을 두 번째 책에서 담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 아픔들도 조금은 아물었는지, 슬픔이 맑게 가라앉아 그것을 가볍게 말할 수 있게 되었나 봅니다. 다음 번 책에서는 독자들에게 햇볕에 말린 이불처럼 보송보송하고
따스한 말들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12년 8월 임매자
펴내는 글 - | 04
1부·거기 딸이 있었다
014 _ 거기 딸이 있었다
018 _ 등불 같은 순백의 스파티필룸
022 _ 눈이 와, 그날처럼
025 _ 아들과 나의 다른 소망
030 _ 독일에서 결혼식을
036 _ 진열품이 된 브리태니커
040 _ 까칠한 막내
045 _ 네 아이디는 파랑이었잖아
050 _ 우리는 고부사이
2부·뭉크에게 짐을 벗어 주다
뭉크에게 짐을 벗어 주다 _ 057
이창동 감독의《 시》 _ 062
박수근의‘ 나목’과 아버지 _ 066
벼룩시장에서 건진 명화 _ 070
어거스트 러쉬 _ 076
입원실에서 달리를 만나다 _ 080
피사로의 튈르리 정원에서 _ 085
천국의 아이들 _ 089
고흐와 최북, 그들의 가난한 자화상 _ 093
어웨이 프롬 허 _ 098
푈클링엔 제철소를 전시하다 _ 102
3부·팜므파탈 능소화
109 _ 네펜데스의 주린 밥통
113 _ 바람난 목련
118 _ 팜므파탈 능소화
122 _ 배추밭에 내리는 싸락눈
127 _ 강화도에서 만난 남자들
131 _ 선두리 포구의 그 갈매기
135 _“사리가 뭐가 그리 중요하노”
140 _ 유럽에서 벼룩이 되어
145 _ 베네치아의 불빛
149 _ 나는 지금도 홍합을 보면 슬프다
4부·자랑스러운 젖가슴
자랑스러운 젖가슴 _ 156
누가 그에게 술을 마시게 했을까 _ 161
영어 교육에 쫓기는 사람들 _ 165
100마리째 원숭이 효과 _ 169
막장 드라마와 김수현 _ 174
스킨헤드 _ 178
현대판 고려장 _ 184
인터넷의 악플 풍토 _ 189
천형 같은 동성애 _ 194
박재범과 애국주의 _ 198
5부·원초적인 그녀
205 _ 원초적인 그녀
210 _ 등으로 말을 걸어 오는 그녀
214 _ 그녀의 정신의 우듬지
218 _ 사이코패스
223 _ 외삼촌과 그날 그 버들강아지
227 _ 남자가 더 편한 이유
231 _ 치매로 떠난 친구
236 _ 덴젤 워싱턴을 닮은 그 남자
241 _ 부용산과 오드리 헵번
6부·중심에서 멀어진 시간
단전호흡 _ 249
접으니 참으로 편하다 _ 254
그 날 _ 258
맥아더 장군 기도문과 태교 _ 262
중심에서 멀어진 시간 _ 267
영혼의 의사, 수필가 _ 272
독일의‘ 핵폐기물 반대’ 시위 _ 275
이제 나와 화해하리라 _ 279
사유의 빈곤을 감추기 위하여 _ 284
*경북 포항 출생
*한국수필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에세이플러스 이사
*테마수필 필진
*수필집 '나를 흔드는 바람' 선우
<은비늘 같은 시간>을 다 읽고 마지막 장을 덮으며 생각합니다. 나의 문학에 대한 가슴앓이는 얼마나 깊었을까. 별로 깊지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학으로 내면의 아픔을 치유했다는 작가의 말이 가슴에 닿는군요. 명화와 그림과 음악 감상에 덧붙여 자신의 내면을 군더더기 없이 표출해 낸 작가의 저력이 느껴져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줄곧 닥치는대로 책을 읽으면서 그 책과 접목된 내 생의 편린을 주워본 적이 있는가. 작가처럼 깊은 눈으로 읽은 적이 없는 것 같군요. 참으로 은비늘 같은 시간의 책읽기였습니다. _소설가 박래여
태풍이 물러가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열렸던 오늘,
우편함에 ' 은비늘 두르고 파닥이는 선생님의 책'이
담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비늘 같은 시간'은
푸른 비단인 청라 (靑羅 )에 예리한 수바늘로
선생님의 감성과 지성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차분히 읽어보며
선생님의 아름다운 감성을
오롯이 느껴보겠습니다.
좋은 책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필가 장은초
태풍이 물러가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열렸던 오늘,
우편함에 ' 은비늘 두르고 파닥이는 선생님의 책'이
담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비늘 같은 시간'은
푸른 비단인 청라(靑羅)에 예리한 수바늘로
선생님의 감성과 지성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차분히 읽어보며
선생님의 아름다운 감성을
오롯히 느껴보겠습니다.
좋은 책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현숙
//은비늘 같은 시간은 화려하지 않다. 담백하다. 연륜을 느끼게 하는 작품 하나하나에서 어쩜 그리도 잘 버무린 비빔밥 같을까. 맛 집으로 소문난 집에서 비빔밥을 먹는 기분이었다. 딸이 미술을 전공하기 때문일까. 작가가 유럽 여행길에서 만난 명화는 내게도 낯설지 않은 작품들이었다. 명화든 영화든 음악이든 작품에 대한 안목도 안목이지만 그 감상문 속에 어쩜 그리도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잘 버무려 넣었을까. 문학은 작가 내면에 감추어진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카타르시스이기도 하다. 아버지와 네 명의 동생을 잃은 그 참척을 당한 이야기도 풀어낼 수 있을 만큼. 마치 옛날 우리 어머니가 두 가닥 삼 줄을 허벅지에 대고 문질러 하나의 올로 만들어 삼베옷을 짓듯이. 잘 버무린 비빔밥은 먹을 때도 맛있지만 먹고 난 후에도 여운이 오래 간다. 간간히 눈물 날만큼 매워 고통스러운 맛도 있고, 되새김질을 할 만큼 고소한 맛도 있고, 더 먹고 싶은 욕구도 일으키는 그런 맛 말이다.
//나이를 먹으니 이런저런 지병과 동거를 하고 있지만, 어디 아프지 않은 생이 있을까. 죽음을 들여다보지 않은 생이 있을까. 아마도 아픔만큼 살아있음을 강렬하게 일깨우는 것이 없고, 죽음만큼 눈부시게 삶을 환기하는 것도 없으리라.//
< 은비늘 같은 시간>속 작은 제목 ‘중심에서 멀어진 시간’에 나오는 한 문장이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