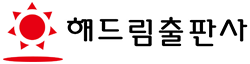- 당신을 바라보는 거리
-
 박수림
박수림 -
 해드림
해드림 -
 2010-03-03
2010-03-03 -
 .
. -
 978-89-93506-18-1
978-89-93506-18-1 -
 7,000원
7,000원

본문
어머니 말씀 속에 색칠하는 날들
어머니 품이 늘 그리웠습니다.
그리운 마음만큼 나는 고향의 하늘로 목을 늘였습니다.
그러다가 무작정 안겼습니다.
제 결정은, 제 무모한 선택은 제 생의 최고였습니다.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넓은 평야가 있고
무엇하나 빠지지 않는 고향의 풍경 속에 제가 있습니다.
가끔 이른 아침 공기를 마시며 친구와 함께 산책을 즐기고
답답한 가슴을 뚫으려 밤 바닷가를 찾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삶의 평화로움을 느껴가며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중입니다.
삶이란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려진 대로 채색되어지지 않듯이
살면서 생각이 막힐 때 성주산 팔각정에 올라
멀리 바라보이는 바다와 보령 시가지를 내려다보며
내 욕심의 줄기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끊어냅니다.
‘산다는 것 별거 아니더라.
오십 줄 넘으니 팔십이 바로 앞이더라.
건강하게 살아라.
인생을 즐길 줄 알아라.
엄마 팔아 동무 사달라고 조른다는 말이 있듯이
친구들과 좋은 만남 이루어라.
산다는 게 별거냐?
웃으며 살아도 모자란 세상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의 지나가듯 스친 말씀이 새록새록 새겨지는 날들
어머니를 노래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던 순간마다
내 詩세계는 늘 고향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말씀 속에 색칠하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03월에 박수림
.펴내는 글 - 어머니 말씀속에 색칠하는 날들 /박수림 * 04
.작품해설 - 부끄러움을 벗어야 감동을 주는 시가 된다/문철수* 119
1. 고향으로
바다는 밤새 소야곡을 노래하고 .012
바다에게로 .013
모래 .014
회귀 (回歸) .015
바다는 잠들고 싶다 .016
바다를 표구하다 .017
길의 추억 .018
예당저수지에서 .020
귀가 .022
마당 .024
머무는 곳이 마지막 자리이다 .025
동거 .026
쑥부쟁이꽃 .027
사랑 이야기 .028
대화 .029
2. 사랑
봄길에 그리운 사람 있다 .032
티눈 .033
관계 .034
뒷모습 .035
그녀 나를 보고 웃더라 .036
꽃길 .037
개망초·3 .038
김밥 연가 .040
허브 .041
평행선 .042
친구에게·3 -첫사랑 .044
친구에게·4 -첫사랑 .045
묻지 마라 .046
보고 싶다네 .048
해원(海原) .049
재회-이별 .050
재회-기다림 .052
재회-그리움·1 .053
재회-그리움·2 .054
그리운 날에 .056
재회-만남 .058
풍란 .059
난시, 겹치고 마는 것 .060
3. 홀로서기
묵밥집에서 추억을 들먹이다 .064
빗줄기에 젖어보는 일 .065
파열(破裂) .066
반란의 끝에 서다 .067
화분 .068
밥의 이론-잡곡밥을 지으며 .070
공간 채우기 .072
꽃비 .074
머물고 싶다-낙엽인 것들의 생각 .076
나를 바꾼다 .077
장마 .078
키 작은 코스모스 .079
강물처럼 흐르다-양평에서 .080
검버섯 .081
구겨졌던 것들이 펴지고 .082
시인(詩人) .084
재떨이 .085
기도 .086
음주예찬 .088
꽃잎에게서 알콜 향기가 난다 .090
화살 .091
담배 .092
종이컵 .093
4. 사계(四季)
안부 .096
석류 .097
들꽃 .098
화왕산 억새 .100
어느 가을에 알게 된 것들 .102
가을 기도 .104
주왕산에서 .106
완두콩밥 .108
한 뼘의 그늘 .110
구속 .112
나를 키우다 .114
꽃이 꽃에게 .116
탱자나무 .118
프로필
박수림 시인은 충남 보령 출생이다. 시인이 초등하교 시절, 서울의 대학생들이 외딴 시골로 농활을 나와 편지쓰기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시인은 글 쓰는 일을 접하게 되어, 오랜 세월 시인의 삶 속에서 시는 떼어놓을 수 없는 운명과도 같았다. 이후 ????한맥문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은, 대천에 거주하며 ????시공???? 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제1시집: 꽃잎 하나 터질 모양이다(해드림)
시인의 카페 http://cafe.daum.net/surim2003
이메일 parkberonica@hanmail.net
부끄러움을 벗어야 감동을 주는 시가 된다
문철수 (시인, 시공문학 대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어디 그리 녹녹한가. 첫 시집 ‘꽃잎 하나 터질 모양이다’를 발표하고 서너 달이 지났을까 두 번째 시집을 내야 한단다. 동인으로, 삶의 선후배로, 가끔 한잔 술을 나누며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로 지내 온 시인이고 항상 사람들과의 만남을 편안하게 해 주었었지만 이번만은 어쩐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박수림 시인의 시는 현란한 언어의 잔치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말 비틀기의 경연장도 아니다. 입에 달콤한 시도 아니고 눈에 확 뜨이는 시도 아니다. 그럼 이도저도 아닌 시로 어떻게 두 번째 시집까지 엮을 수 있다는 말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박수림의 시는 순수한 여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치장 없는 순수함이 가져다주는 유순한 감동이 파문처럼 가슴 아래를 지긋이 자극하기 때문이다. 첫눈에 사로잡고는 봄볕에 녹아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가 아닌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에 한 덩이 빚을 얹어주는 것 같은, 서러움의 무게로 누르며 그리움의 스크린으로 비춰주는 시라고 할 수 있다.
동인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선배 시인은 “박수림 시인의 시는 읽을수록 눈물이 나요. 다시 보게 되요. 내가 그 시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요.” 라며 박수림 시의 진정성에 대하여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시의 진정성이나 시적 신념은 첫 시집에 수록 되어 있는 ‘고드름’이라는 시에 잘 나타나 있다
웬만한 오기가 천성으로 타고나지 않으면 / 저 짓도 못 할 일이다 / 젖은 삶 제 탓으로 얼리며 / 하필 낭떠러지 붙잡고 세상 바라보는가 / (중략) / 투명한 것은 죄가 아님을 물구나무로 서서 / 흔들림 없이 시위한다지만 / 너와 나 사이에 통하는 길은 없다 / 너는 투명하지만 나는 불투명하다 [고드름 부분]
1. 이별역에서 희망의 기차타기
어떤 시인의 작품이라도 그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쯤 자신을 내려놓고 시인과 같은 상상의 바다로 흠씬 빠져드는 것도 해 볼만 한 일이다. 더구나 박수림 시인의 작품처럼 시가 삶의 아픔과 사랑의 그리움에서 출발하였을 때는 더욱 그렇다.
세상 모든 만사가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되뇌어볼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것이 나모르게 되어 질 때가 더 많은 법이다. 언제 이별했는지 모를 일이다 / 한때는 너밖에 모를 삶이라고 / 온 몸 다 바쳐 사랑 고백했던 일 / 서너 번의 오르가즘 날마다 느끼며 / 세상 다 얻은 듯 황홀했던 일 / 눈부신 네 모습 뽀얀 순정에 / 넘어가지 않고는 배겨날 수 없던 일 / 십수년 너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 [밥의 이론 부분] 속에서 시인은 밥을 핑계로 은근히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다. 그 이별의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으나 뽀얀 순정에 십 수 년 바라보았다면 벌써 한참인데 오랜만에 밥상을 마주 대하고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그때 그 사랑을 밥에 김치 얹듯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별의 고통과 잘못을 입맛에 빗대어 눙치고 있지 않은가.
나이 들면 입맛도 변한다고 / 너 닮은 그이 정은 안가지만 / 내 마음 바꿔보기로 했다 / 내키지 않은 손길 자꾸 뻗었더니 [밥의 이론 부분] 입맛도 돌고 그토록 원수 같던 떠나간 그이에게서도 사랑이 느껴지더란 말이다. 가슴 아픈 이별 묻어둔 자리에도 / 사랑은 새순처럼 돋아난다는 걸 알았다 / 나를 키운 너 [밥의 이론 부분] 그래 내가 이토록 성숙하여 너를 이해하고 그리워하게 된 것 또한 ‘너‘ 때문이란 걸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렇게 원치 않은 이별 뒤에 깨달음과 함께 스며드는 그리움은 원래의 자리에 ‘너’를 다시 앉히는 긍정의 모습으로 변하여 있다. ‘너 닮은 그이’는 ‘이별’했지만 ‘사랑’했고, ‘순정’과 ‘추억’ 속에 있어 ‘생각’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아닌가. 밥이 그이고 사랑이고 그가 매일 밥처럼 차려주는 추억이라는 상은 결국 자신인 나를 성숙시켜 또 다른 시작을 꿈꾸게 하였다. 그 이별이 가져다 준 것은 정신적 공허와 육체적인 허기를 동시에 가져왔을 수도 있으며 원치 않는 새로운 사람하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 밥을 끊고 새롭게 얻은 것은 빠끔히 들여다보며 침묵을 건드리는 너 / (중략) / 숭숭 뚫린 가슴속을 / 향기롭게 채워가며 다독이는 너 [관계 부분]는 밥상위에 새로 마주한 한잔 술이었다. 달다 쓰다 투정할 필요도 없으며, 오라 가라 따질 이유도 없이 마음 맞을까 때론 의심해보지만 / 쓴맛 그대로 / 단맛 그대로 [관계 부분] 인정 해 주며 사는 맛이 진정 사랑이고 시인이 추구하는 사랑의 방법일 거라는 생각에 머문다.
그런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 보지만 정작 시인에게 있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관계는 빈집 신발 벗기도 전 / 현관문 열어놓은 채 / 스위치부터 켤 때 / 가득한 냉기 소름 돋도록 무서웠어 / 한밤 중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공간 채우기 부분]와 외로움 그리움과의 관계가 우선되어 있다. 단절된 소통의 문제는 혼자일 때 더 절실한 것이다. 그것은 외부에서 가져다주는 공포보다도 더 심하게 시인을 겁박하는 외로움이었던 것이다. 외로움이란 그런 것이다. 깊은 산중에 홀로 버려져 낯선 불빛과 낯선 사람들의 흘깃거리는 까칠한 시선마저 도리어 깊은 위로가 되게 하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상쇄되거나 습관 되지 않는 그것이 외로움인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포기하지 않는다.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인지 되짚을 이유도 사라진지 오래다. 쉴 새 없이 흐르진 않아 / 때로는 마르다가 때로는 넘쳐나다 / 그러다 그치겠지 [공간 채우기 부분] 라며 다소 냉소적 체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삶의 경험에서 오는 습관적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일 것이다. 시인 박수림의 시는 어느 한편이라도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없다. 시가 생활이고 생활이 곧 시이며 자기성찰이고 고백인 것이다. 고백의 아픈 과정을 통하여 시인은 이별의 공간에 희망을 그려내고 있다. 삶과 유리된 시, 체험의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는 시에서 진실과 감동을 만나기는 어렵다. 시는 연필 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바닥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던가.
2. 거울 안에서 바라보는 나
누구에게나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란 끝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방향을 수정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과정의 반복이랄 수 있다. 그렇다면 시인은 지난한 고통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종착역이 어떤 모습이길 원할까. 시인은 길을 떠나는 사람이다 / 쉬어갈 줄 아는 사람이다 / 방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 꽃을 피우는 사람이다 / 그대로 잠들었다 세상 하나 이루는 꿈을 꾸는 사람 이지만 그보다는 시인은 그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시인 부분]. 길을 떠나는 맛, 쉬는 맛, 어리석은 맛, 꽃을 피우는 맛, 꿈을 꾸고 세상을 세우는 맛 그런 행위에서 나오는 깊고 깊은 인생의 젓갈 같은 맛을 알고 그 맛을 즐기는 사람, 별을 따라가며 높은 산 앞에서도 화내지 않으며 실과 허의 바람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절망과 고통으로 연속된 삶도 어떻게 하면 그 삶이 의지의 산물이 되고 어둠의 빛이 되며 남아있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는지 아는 것이다. 스스로 넘어졌다 누워버리고 / 그대로 잠들었다 세상하나 이루는 / 꿈을 꾸는 사람 [시인 부분] 이라는 3행은 ‘쉬어갈 줄 아는 여유로운 사람만이 세상하나 이룰 수 있는 큰 사람이다.’ 라는 명제를 던져주며 정작 시인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꿈을 꾸지만 현실을 벗어나지 않고 삶의 유동성을 인정하려는 듯 가지 끝에 달빛으로 머물다 길을 잃고 마는 사람 / 물방울 하나로 강물도 이루는 / 시인은 언어 속에서 그리움을 채우는 슬픈 사람이다 [시인 부분] 라고 읊조리며 삶의 노련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슬픔을 채운다는 것은 결국 기쁨에 다다랐다는 뜻이다. 비워내는 일이 자신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연에 대한 순응의 자세를 보이며 그것에 역행하거나 거스르지 않으려는 태도와 물질적인 것에서 영혼의 문제로 깊숙이 빠져드는 것을 느끼게 된다. 서둘지 않아도 물이 오르면 / 가만히 눈 뜨고 세상을 볼래요 / 앞서 간 흔적들의 체취 속에서 / 요란한 잉태는 거부할래요 / 아침마다 안개이불 걷어내다 보면 / 차츰 마음을 열어 갈테고 [쑥부쟁이 꽃 부분] 마음을 연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에 대한 영혼의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뿌리로부터 매년 새로운 줄기를 세우고 새로운 꽃을 피우듯 자신은 하나지만 매일 매년 세상을 대하는 마음은 늘 새롭고 신선하며 아름답게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여유 있는 마음가짐이 박수림 시인이 세상을 대하는 방법이다. 대상 속으로 이입되는, 대상과 하나가 되어 말 못하는 것들이 말을 하고 생각 없는 것들이 철학을 하는 경지에 다다르게 되는, 현상과 본질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느낌을 따뜻하고 희망을 품은 알로 낳는, 숨을 불어넣는 비상한 재주, 그것은 가식적이지 않고 꾸미지 않으며 진솔하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시 속에서 고르고 섬세한 호흡과 미소, 흐트러지지 않는 아름다움, 그리고 세상과의 이별까지 쑥부쟁이 꽃을 바라보며 담담이 자신의 길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제 아무리 고단해도 처음 맘처럼 흐트러지지 않고 / 가을의 분신으로 아름답게 피었다가 / 서리꽃 받아 이고 떠나갈래요 [쑥부쟁이 꽃 부분] 라며 자신의 삶의 모습을 아니 모든 삶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쑥부쟁이 꽃을 바라보며 진한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인의 삶이 현실에 순응하는 피동적인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비쳐지는 것에 대하여는 경계하여야 한다. 시인에게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상처와 품고 있는 억새 같은 날을 세운 푸른 이파리 몇 개 [화왕산 억새 부분]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리어 칼날 하나 감추지도 못하고 사는 삶이 도리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이 지 않겠는가. 시 ‘화왕산 억새’는 그런 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과 함께 사랑이라는 인간의 본질적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창녕의 하늘도 빠져버릴 백옥 같은 웃음, 비단 같은 속살, 꺾일 듯 말듯 휘는 허리 [화왕산 억새 부분]를 가진 시인의 여성성을 보이는 작품이랄 수 있다. 그것은 화왕산 억새라기보다 시인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시인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은 꿈꾸는 맛을 아는 사람 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시인은 모름지기 꿈을 현실 같이 꾸며 현실을 꿈같이 사는 사람이겠다 싶다. 현실을 채우고 비우는 일, 꿈을 세우고 지우는 일, 사랑을 꿈꾸고 깨는 일이 다 같은 의미선 상에 있다. 그것이 꿈이던 현실이던 원고지 더미를 쌓아가는 일 그 중심에 서있는 것이 시인이 원하는 삶이고 거울에 비쳐지길 원하는 모습일 것이다.
3. 마주볼 수 없는 먼 길 위에서
내 목소리 당신 향한 원망으로 높일 때 마다 / 대못 박는 소리로 되돌아와 / 어둠이 밀려드는 밤이 오면 / 아무도 없는 벌판으로 달려 나가 / 피 맺힌 울음 / 소리 없이 끄집어내어 / 지난 삶 함께 묶어 무덤을 만듭니다 [기도 부분]. ‘기도’ 라는 제목의 시는 기실 기도라기보다 애원에 가깝게 느껴진다.
박수림 시인에게 있어서 많은 것이 존재의 근원적인 외로움에서 기인한다. 삶이 빚으로 남고 고통과 슬픔으로 점철되는 것은 사실상 한 존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세계에 직면하는 아득함 때문이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단절감이고 세상에 함께 할 다른 사람이 곁에 없다는 소외감이기도 하다.(황정산 평론가) 그러한 소외감 때문에 “지난 삶 함께 묶어 무덤을 만든다” 는 말로 모든 과거를 정리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물론 죽음을 위한 정리가 아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관계를 위한 과거와의 단절이라고 잘라 말 할 수는 없지만 마주볼 수 없는 먼 길 위에서 [평행선 부분] 지쳐가는 자신에게 먹여야 할 영양제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리움에는 긍정적 그리움과 부정적 그리움이 있다. 긍정적 그리움이란 에너지를 충만하게 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부정적 그리움이란 에너지를 소비하여 탈진하게 하며 포기하게 하고 메마르게 한다. 그리움은 초기에는 긍정적이었다가 중기에는 부정적으로 변하며 말기에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 ‘평행선’ 이란 시는 그 관계에 대한 시인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어떤 이에 대한 절대적 그리움과 그 그리움을 유지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녹아있는 것이다.
마주볼 수 없는 먼 길 위에서 / 그대의 작은 가슴에 나를 던진다 / (중략) / 평행선으로 살아갈지언정 한시라도 / 그대여 떠나지 마라 / 그대의 그리움 속에 또는 눈물 속에 / 기력없이 살아가는 내가 있다 [평행선 부분] 는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마지막 까지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평행선이란 기차의 선로처럼 항상 그 거리를 유지하게끔 무언가 밀어주고 당겨주는 것들이 있어야 가능한 법인데 그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에서 그리움은 떠나감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보다 덜 아픈, 바라볼 수 있는 관계로 유지됨을 알기에 이러한 고백을 던졌으리라.
박수림 시인의 시 곳곳에서 보이는 죽음이라는 단어와 외로움, 그리움, 고통과 슬픔이라는 단어까지도 부정적 견해로 해석되어질 만큼 어두운 면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는 항시 희망의 샘을 길어 올렸기 때문인데 ‘머물고 싶다 - 낙엽인 것들의 생각’ 이나 ‘음주예찬’ 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다소 어둡고 침침한 체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 ‘머물고 싶다 - 낙엽인 것들의 생각’ 전문을 보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곳에서
고달팠던 한 생 조용히 내려놓고 싶다
지난 세월의 바람
스치고 지나간 욕심의 부피일 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연연했던 삶
그 엉뚱한 것에서 한 꺼풀 벗어나
이제 두른 표피 없이 가볍게 날고 싶다
그 가벼움에 나를 버리고
고즈넉한 안식을 찾아
고달픈 날개 조용히 접으면
무심의 세상으로 돌아갈까
한 겹 한 겹 나를 알수록
흑백 없는 고요함에 편안히 들고 싶다
그러나 시인이 정작 가장 신경 쓰는 일은 아마도 자기 삶에 있어서 누구와의 관계나 죽음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작 자신을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도 있는 “소문”이었던 것 같다. 벙긋벙긋 놀라서 다물지도 못하는 입 / (중략) / 호롱불 앞에서 쉬쉬하며 연애편지 쓰던 시절 / 언제적 일인데요. 그때도 소문은 제 발로 나갔어요 /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내버려 두세요 / (중략) / 우리 모두 소문 따라 이만큼 왔잖아요 / 알고 보면 우리도 누군가의 소문이었어요 [꽃길 부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입에 올릴 때마다 사실들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는 일, 여자의 삶은 항상 소문의 중심에서 멀어지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때문에 시인의 삶이 사람에게서 일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그 외로움의 변방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작품에 등장 시키게까지 하였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해 본다.
필시 박수림 시인의 시는 자신의 삶 전부를 영혼이라는 필터로 걸러낸 찌꺼기라 말하고 싶다. 시를 쓰는 자의 영혼이 맑지 못하면 그 영혼을 통해 나오는 시들이 감동을 주지 못할 것이고, 잘 썼지만 약국에서 주는 약 같이 조제된 시라면 또한 감동을 전달하지 못할 것이다. 박수림의 시가 눈물과 감동을 선물하는 것을 보면 맑은 영혼을 통과하지 못한 피안의 낯선 것들과 시인이 아직 그토록 갈망 하지만 이루지 못하였거나, 항시 그리움의 대상에서 더 이상 승화시키지 못한 갈증 - 그것들을 소금기 없이 볶아내는 솔직함이 박수림 시인의 시다. 잘 썼지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시와의 분명한 거리가 있다.
이 두 번째 작품집은 박수림 시인의 과거와 이별하는 이혼서류 같은 작품집이 되기를 바란다. 고통과 그리움의 검은 구름은 한여름 소나기 같이 보내고 이제는 보령의 태양과 보령의 바다가 이끄는 밝고 희망찬 또 다른 그리움의 작품들을 쏟아내길 부탁한다. 항시 새로움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지난 것에 묶여있지 말아야 한다. 박수림 시인의 시 ‘모래’에서 노래했듯 쌓아야 머물 수 있는 줄 알았지 / 빈말 없이 허물어야 한다는 것 / 사랑은 [모래 부분], 그리고 삶은 허물고 비워내야 새로운 것들이 자리 잡고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것이다.
‘돈 소유 그리고 영원’의 저자 랜디 알콘의 말을 빌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위조지폐를 만난다 할지라고 진짜 돈은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며 안타까워했다. 같은 이유로 진짜 시인은 없다 라는 우리의 자조적인 한탄도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